|
‘무당’이나 ‘점집’은 한국 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독특한 키워드다. 최근 조폭이 무당의 역할을 한다는 독특한 영화가 개봉한 것처럼 국내 영화에서도 ‘무당’을 소재로 한 키워드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류가 퍼지면서 국내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도 커져 외신에서도 무당이나 굿, 점집 등을 국내의 독특한 종합예술로 조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은 우주의 만물에 각각 그 존재에 상응하는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규정한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자리를 비롯해 산과 들, 바다와 계곡, 가택의 대들보와 부뚜막 심지어 화장실과 굴뚝가지도 그 자체로 혹은 그곳에 신격이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무속신앙은 자연신과 인신, 유형신, 무형신 등으로 신앙의 대상이 무한하게 분포되어 있어 유일신이나 교주 등을 내세우는 여타 종교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범우주적인 신관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속신앙은 자연발생적인 원시종교 형태의 틀을 벗어나 나름의 체계와 질서를 갖췄다.
국내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체계 중 하나는 바로 무당과 굿이다. 무속신앙에 따르면, 무당은 신을 받아 모시는 영매 혹은 사제자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신내림’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체험과 특정한 과정을 통해 신의 제자로 임명되어 신과 인간 사이에서 다양한 종교적 주술과 의식들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굿의 경우 질병의 퇴치, 초복, 초혼, 안택, 기우, 진령, 제재, 천신, 축귀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진행된다. 각 지방마다, 또는 계절마다 그에 어울리는 굿이 있듯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꼽히는 굿은, 무당이 중간 매게체로서 신과 접촉하여 굿을 신청한 사람의 소망을 비는 하나의 제의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주나 운세 또한 한국의 무속신앙인 ‘신점’의 방법이다. 무당 등 역술인을 통해 신의 계시를 받아 운세를 점치고 각종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는 방법인 신점은 사주, 운수, 신수, 단시, 멸액, 절초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일산에 위치한 점집 ‘금하랑’ 관계자는 “굿 이외에도 제가집의 형편과 규모에 따라 고사, 치성, 기도, 비손, 뱅이 등 다양한 형태의 무속 제의를 들일 수 있다”며 “한국의 무속신앙은 미신이나 망상이 아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천지신명의 힘을 빌어 모색해보는 한국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이자 종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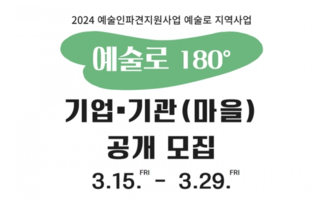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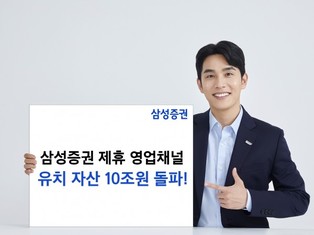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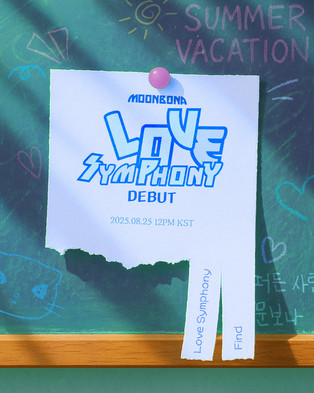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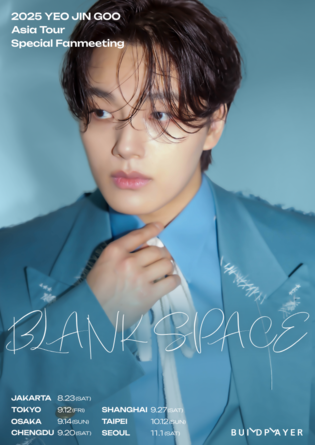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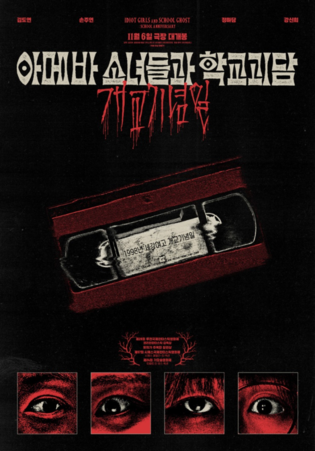



































![[포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news/data/20201216/p1065581836741294_996_h2.jpg)
![[포토] 정세균 총리, 설 물가안정 현장점검](/news/data/20200122/p1065572357695249_851_h2.jpg)
![[송진희의 커피이야기 #12] 화가 고흐와 그가 사랑한 예멘모카](/news/data/20191231/p1065603108403865_739_h2.jpg)







